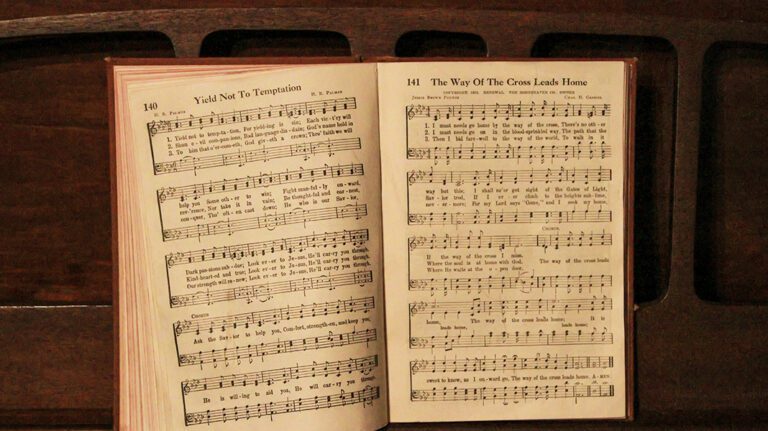르네상스의 3대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면에 그린 <최후의 심판>은 1500년 이후에는 다루지 않았던 ‘심판’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주제가 다시 그려진 이유는 부패한 구교에 대한 화가의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다.
이 벽화가 1533년부터 구상되었으니, 1517년부터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가의 분노는 그림의 구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91명이나 되는 많은 인물을 한 화면에 배치시킨 미켈란젤로는 아래 부분이 두터운 피라밋 형태의 안정적인 구도를 버리고, 윗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여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구도를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공의의 심판자가 죄를 대하는 성스러운 분노의 표현이다. 더 나아가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서 미술에서의 전통적인 관습을 비틀었다. 가운데 자리한
그에게는 권위를 뜻하는 수염이나 후광도 없지만, 심판자의 전능함과 거룩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뿜어져 나온다. 실로 구원은 세상의 논리나 관습,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것, 즉 믿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분노, 공의, 처절함, 전능함, 죄와 구원 그리고 사랑, 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표출된 <최후의 심판>은 장엄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며 ‘심판의 그날’을 상상해 본다. 처음 이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두려워 주저앉았다는 교황의 일화를 떠올리며, 자신을 점검해 본다. 이 그림에서 내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그림설명: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537-1541년, 프레스코화, 시스티나 성당 벽화)
이상윤(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