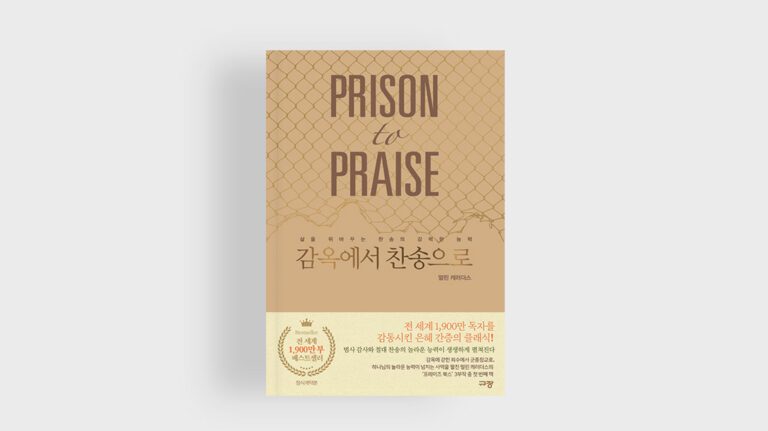▶한스 홀바인(Hans Holbein the Younger), <대사들>, 1533년, 오크 패널에 유화 채색, 207x210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전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나님의 사람이며, 왕이었던 다윗 또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역시 이러한 ‘죽음의 평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은 장 드 댕트빌(Jean de Dinteville)과 죠르쥬 드 셀브스(Georges de Selves). 이들은 프랑스 국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엄친아’였다.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이들은 각각 29세의 정치인, 25세의 성직자였으며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에 파견되었고 이곳에서 독일 화가 홀바인을 소개받게 된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다시 말해 당대 최고로 잘나갔던 20대였다.
이러한 그들의 사회적 배경은 가운데 탁자에 놓인 진귀한 물건과 화려한 복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명품 카페트와 첨단 과학 기구들, 그리고 프랑스 영국 간의 종교적, 외교적 화합을 뜻하는 악기 등 탁자 위의 물건들은 현재의 안락과 동시에 보장된 미래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림에 반전이 있다. 전경의 해골 때문이다. 정면에서 몇 걸음을 옮기다 보면 찌그러지지 않은 완전한 해골의 모습이 나타난다. 잘나가는 젊은이들의 초상화에 죽음의 메시지를 그려 넣다니…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였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의 초청을 받아 영국에 온 홀바인은 자신을 초청한 모어가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허망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음을 기억하는 겸허함을 배웠다.
그러나 이 그림이 단순히 삶의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 놀라운 이유는 왼쪽 커튼 뒤에 살짝 드러나는 십자가 때문이다. 막 바깥의 연극 무대와 같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진짜 삶, 즉 화가가 비밀스럽게 말하고 싶었던 진실은 결국 영으로 부활하는 새 삶이었을 것이다.
[GNPNEWS]
글. 이상윤(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