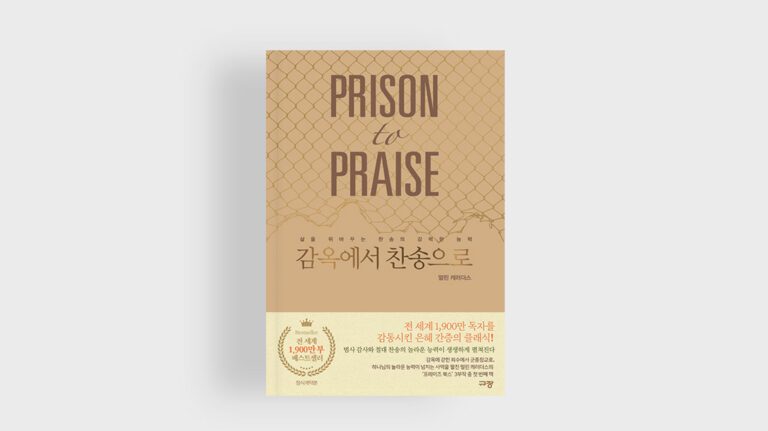(Piss Christ)>, 1987
안드레아 세라뇨의 <오줌 그리스도>
불그스레하게 빛나는 바탕에 흐릿한 십자가가 놓여 있다. 가톨릭 사진작가 안드레아 세라뇨(Andres Serrano)의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되고 난 뒤, 뉴욕 주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상원의원 알폰소 다마토(Alfonso D’Amato)는 세라뇨의 작품이 실린 도록(圖錄)을 청중 앞에서 박박 찢어버렸다. 이런 부도덕한 예술가에게 정부의 예술 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상원의원 제시 헬름스(Jesse Helms)도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세라뇨는 항상 종교적 도상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고,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십자가의 배경이었다. 그것은 바로 작가의 소변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세라뇨가 제목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짓지 않았다면 논쟁을 피할 수도 있었다. 작품만 보면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담근 액체가 무엇인지를 굳이 알리려 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대중들의 공분을 산 작가는 의외로 자신은 결코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문당했다고 쓰여 있다. 십자가는 매우 추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십자가를 우리식으로 미화하기에 급급하다. 실제 십자가 사건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사회는 종교 공예품을 믿음의 대용품인양 착각하고 쉽게 거래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스러움을 더럽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류의 물질적이고 감상적인 예배를 추방하고 싶다.” “오줌이 정말 더러운가? 오줌을 더럽다고 가르치는 관습이 모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리고 2년 뒤, 이번에는 순수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우유 속에 예수님의 두상을 넣은 <하얀 그리스도>를 발표했다. 세라뇨의 두 작품을 보며 마음속에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다.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소변일까. 그 처절한 사랑을 잊고 사는 나의 일상일까. 세라뇨의 작품이 모욕일까. 곳곳에 걸어 놓은 십자가를 당연시하는 나의 무감각한 시선이 모욕일까. [복음기도신문]
이상윤 미술평론가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gnpnews@gnm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