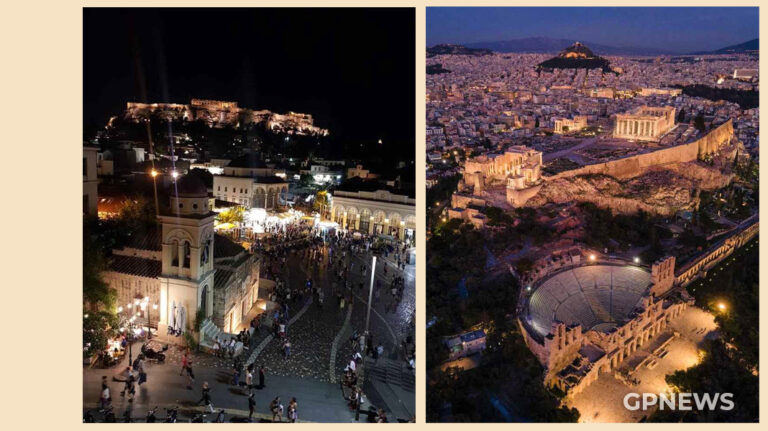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최근 LBC 뉴스의 레이첼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나는 나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신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좋아하고 또 기독교적 에토스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이었다.
영국 전역에 풍경 장식용으로 대성당과 교구 교회가 있는 것은 그에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전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도킨스의 인터뷰는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다. 무신론자조차도 어떤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 같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가 옳았다. 서구에서 이제 기독교의 신학적, 도덕적 주장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더 이상 사회를 통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신”이 죽었다는 그의 말은 맞다.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시작된 서구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는 서서히 이교를 탄압하고 문화적 패권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애초에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카이사르의 시대가 다시 한번 다가왔다. 퍼시 잭슨의 소설에서처럼 이교도 신들은 우리 세계에 거주하면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고 도덕적 상상력을 알리는 영적 실마리가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이교적으로 변해가는 지금,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모델은 바로 고대 교회이다.
이교 시대로의 복귀
영국의 정치 평론가인 페르디난드 마운트(Ferdinand Mount)는 Full Circle: How the Classical World Came Back to Us에서 현대와 고대의 도덕적 다양성 사이의 유사점을 독특하게 설명한다.
기번(Gibbon)이 인간 행복의 정점으로 여겼던 서기 2세기 안토니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는 종교적 선택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었다. 당신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고, 또 아무것도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점성술사, 뱀 마술사, 예언자, 점쟁이, 마술사가 주변에 즐비했다. 여섯 가지 창조 신화와 다양한 부활 신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당신이 교육받은 엘리트였다면, 루크레티우스의 시를 읽고 우주에 대한 엄격한 유물론적 설명에 심취했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시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했다. 인간 정신이 만들어 낸 가장 이상하고 열광적인 창조물이 가장 아름다운 비전, 가장 영감을 주는 영적 도전, 가장 도전적인 과학적 탐구 노선과 함께 섞여 있는 시대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빼고는 그와 비슷한 시기는 그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없었다.
2세기를 지금 시대와 가장 흡사하다고 보는 건 마운트 혼자가 아니다. 역사가 칼 트루먼(Carl Trueman)은 The Rise and Triumph of the Modern Self(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의 끝부분에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다. 마찬가지로 법학자 스티븐 D. 스미스(Steven D. Smith)는 Pagans and Christians in the City에서 2세기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독교 문화가 나아갈 길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추정되는 원인이 만든 공백이 이교주의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교와 기독교 사이 고대에 있었던 투쟁이 새롭게 반복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내재적 프레임
고대 이교도 세계와 지금 세계 사이의 주요 유사점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전적인 관심이다. 극히 짧은 시간의 파편을 향한 인간의 편협한 초점은 T. S. 엘리엇이 부르는 것처럼 “현대 이교도”의 한 형태이며 지금 서구를 지배하고 있다. 스미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초월에 대한 진지한 비전이 부족한 이교도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대한 관점이 축소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와 다른 몇몇은 이러한 초월 거부의 또 다른 증상인 “표현적 개인주의”를 향한 현대적 경향에 주목한다. 고대 이교도와 현대 세속주의자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세상과 당면한 문제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사람들이 즉각적인 세계와 내면의 사람을 실재의 중심으로 파악하는 “내재적 프레임”을 설파한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설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세상, 이 시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초월적인 것도, 또 시간을 초월하는 실재는 없다.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도 없다. 이교 세계에서 로마 제국은 그들의 내재적 프레임이었고, 개인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제국의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유용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점에서 움직인다.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충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는 순례자이다.
문화적 성화의 추구
카이사르 시대에 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른 거룩함과 일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문화적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화적 성화 과정을 위해서는 신앙의 수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전파,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 주는 미덕의 가시적 구현이 필요하다. 오래전 그들은 비록 사회의 언저리에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훨씬 더 나은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웃에게 설득했다.
폴리카르푸스, 순교자 저스틴,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문화 엘리트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층에서 일하면서도 이교 세계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교회를 인도했다. 그들은 원로원이라는 주요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다양한 철학 학교를 가득 채운 지식인 그룹도 아니었다. 그 대신 그들은 “유기적”으로 활동했다. 진지하고 강력한 형태의 교리 교육과 제자도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을 기독교 교리와 도덕으로 천천히 인도했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교회는 부서진 사람, 낙담한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학교였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은 진정한 인간 번영을 향한 길을 인도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공적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함을 강조했던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다.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제자훈련 받은 초대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사도들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공경하는(벧전 2:13-14)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함양했다. 동시에 문화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교 세계의 미덕과 악덕을 탐색하는 영적인 삶을 배양했다. 이 모든 상황 가운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때 끝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서로를 격려했다.
계속되는 신뢰
우리 세계와 고대 세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그들과 달리 기독교 문화의 소멸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져가는 기독교 제도를 보면서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제도의 부활과 새로운 제도의 창조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전략이 신중하게 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야 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신들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따라서 오래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원문: God Is Dead. Long Live the Gods.
스티븐 프레슬리 Stephen O. Presley | Center for Religion, Culture, and Democracy의 시니어 펠로우이며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교회 역사 부교수이다. 지은 책으로는 Cultural Sanctification: Engaging the World like the Early Church가 있다.
이 칼럼은 개혁주의적 신학과 복음중심적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2005년 미국에서 설립된 The Gospel Coalition(복음연합)의 컨텐츠로, 본지와 협약에 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www.tgc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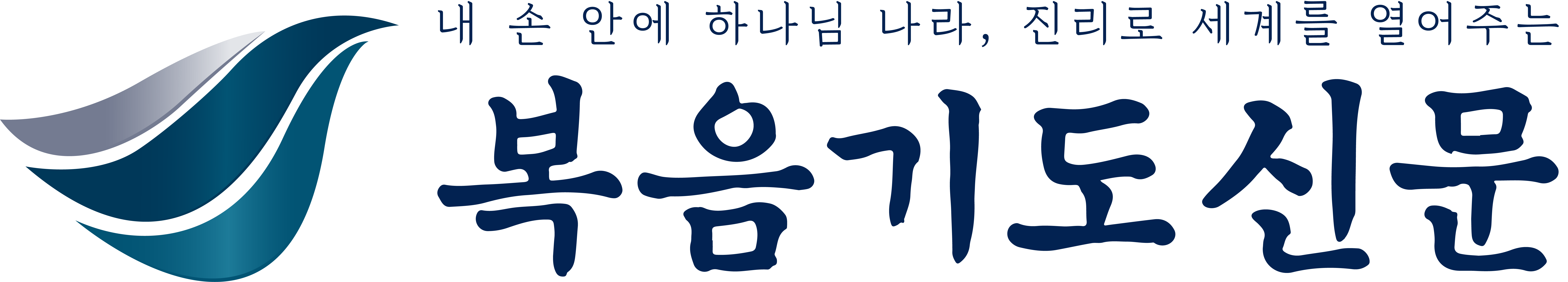

![[TGC 칼럼] 이교 세계에서 바로 사는 법 1 Print Friendly, PDF & Email](https://cdn.printfriendly.com/buttons/printfriendly-pdf-email-button-notex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