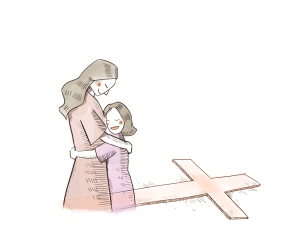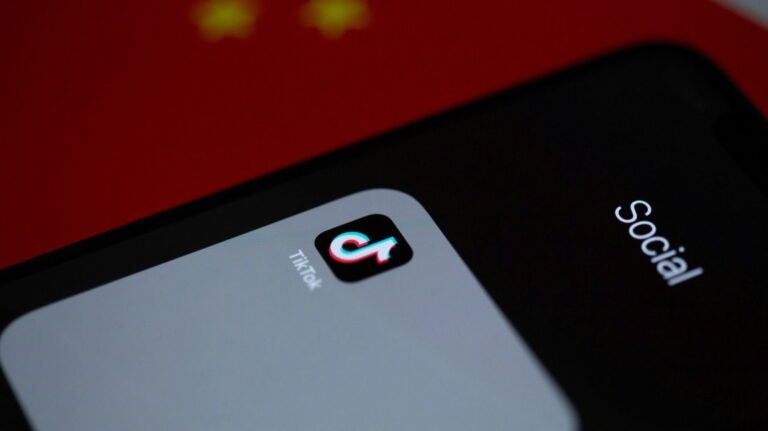지방에서 선교동원을 하며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이다. 어느 날 동역하던 간사님이 지나가는 말을 하듯 물었다. “선교사님은 세 아이의 엄마니까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네.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상황을 통해 주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돼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에 계속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다가도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삶을 뒤돌아보니 아이들을 키우며 11년 차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과정을 겪었다. 준비도 없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는 고사하고 엄마가 어떠한 존재이고 의미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며 살아야 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울며 보챌 때는 아픈 것인지, 뭘 원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다. 유명 육아서적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되고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아이들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어느덧 큰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였다. 함께 사는 사역자들이 늘고 센터에 방문하는 외부 기도자들도 많아지면서 섬겨야 할 사역이 늘어났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에도 나는 세 아이들과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묵상도 나누고, 어린이 선교훈련도 하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했다.
그런데 첫째 딸이 “나는 엄마가 수아 엄마만 했으면 좋겠어요. 산책도 둘이서 가고 싶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또박또박 부를 때는 주로 부탁할 때, 혼낼 때, 명령할 때였다. 그 외에는 늘 세 아이를 한꺼번에 “얘들아~”하고 부르고 있었다. 항상 이해하고 오히려 헤아려 주던 큰 딸이 원하는 것은 소박하게도 “수아야”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다.
딸은 멋진 믿음의 영웅이 된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춰주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누며, 단둘이 손잡고 산책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나눴던 묵상을 곱씹어 마주 앉아 복음일기를 쓰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분초마다 함께 하신 것처럼, 작디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가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비로소 ‘좋은 엄마 되기’라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인 된 나를 복음으로 낳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늘 불러주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가장 어둡고 메마른 ‘엄마’라는 영역 안에서 이미 분명하고 생생하게 응답하고 계셨다.
얼마 전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성하는 기독대안학교에 지원한 딸이 친구에게 “선교사 자녀로 사는 건 힘든데 선교사로 사는 건 행복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길러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엄마로, 동역자로 함께 서길 기도한다. [GNPNEWS]
이현지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