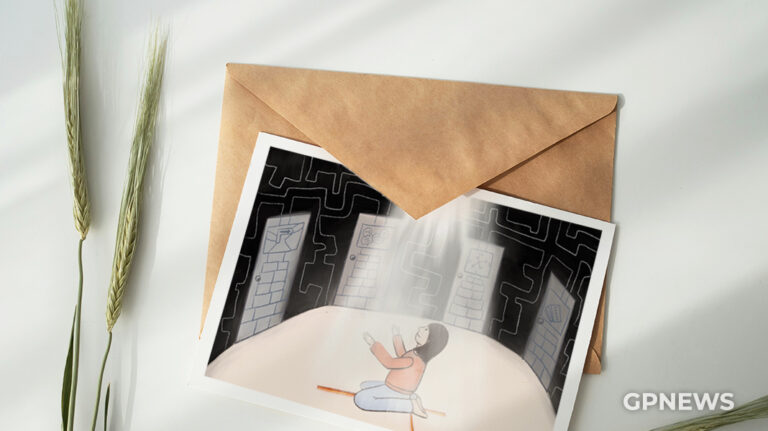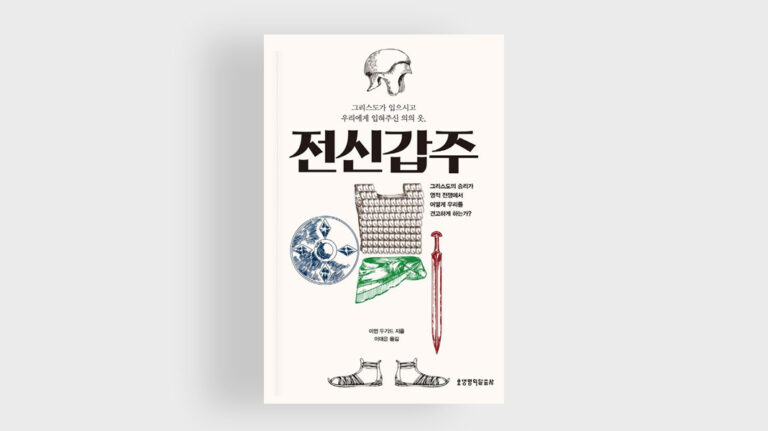이 땅 첫 교회들을 찾아: 부산진교회
이 땅 첫 교회들을 찾아 대한 강토에 선 첫 세대 교회들을 찾아 떠납니다. 그 이야기들에서 우리 신앙의 근원과 원형을 찾아보려 합니다.
부산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제물포보다 먼저 발을 디뎠던 곳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입국 시점을 제물포로 하는 것에 대해 부산 지역의 이견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1884년 알렌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국내에 시작된 선교의 역사는 서울로부터 시작되었고, 부산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라는 점이다. 물론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선교사들의 입국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사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인천을 통해서 입국한 선교사들은 서울에서 나름의 준비를 한 후 부산 선교를 위해서 부산으로 가야 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부산을 찾은 사람은 1890년 호주장로교회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와 그의 누이 매리(Mary)였다. 데이비스 선교사 남매는 1889년 10월에 입국하여 서울에서 5개월 동안 언어연수를 한 다음 부산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천연두와 폐렴에 걸린 데이비스는 고통 중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착한 다음 날 그는 별세의 길을 가고 말았다. 부산 선교의 비전을 품고 부산에 도착한 그였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부산 선교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의 희생에 관한 소식이 본국 호주장로교회에 전달되었고, 호주장로교회는 데이비스의 비전을 자기네 몫임을 확인하고, 이듬해인 1891년 10월 맥케이(James H. Mackay)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를 부산에 파송하여 부산진(좌천동)에 선교부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본격적인 부산 선교의 시작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게일(James Scarth Gale)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1888년 12월에 입국해서 이듬해인 1889년 황해도와 해주를 비롯하여 전국을 순회하다가 그해 8월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1년 남짓 부산에 있었다. 또한 그보다 앞선 성공회교회의 월푸(John R. Wolfe) 선교사는 1885년 중국인 전도자 2명과 함께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정주한 선교사는 게일이다. 그는 후에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한 인물이 되었다.
한편 미국 북장로교회는 호주장로교회보다 늦은 1891년 9월 베어드(William M. Baird)를 부산에 보내어 초량(영주동)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부산 선교를 시작했다. 따라서 부산 선교는 짧은 시차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시점에 호주장로교회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두 선교부는 1993년 1월에 열린 장로교선교부연합공의회에서 부산과 경남지역 선교를 연합으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두 선교부에 의한 부산 선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다음 두 선교부는 선교지 분할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경남의 남부와 서부(기장, 언양, 양산, 거제, 진채, 고성)는 호주장로교회가, 경남의 동부와 서부(김해, 웅천, 밀양, 영산, 창녕, 칠원, 창원)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맡기로 협의했다. 또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 동래, 마산은 두 선교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이러한 협의가 있기 이전에 진주는 호주장로교회가 1905년에 거점을 확보했고, 호주장로교회 지역인 밀양에 북장로교회가 거점을 만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선교지 분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북장로교회 선교부 같은 경우는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주력하고 있었고, 중부지방(경기도 일부와 충북)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지역까지 감당하는 것에 큰 부담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1909년 두 선교부는 협의를 통해서 북장로교회가 맡았던 동부와 마산 지역을 호주장로교회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1913년 북장로교회 선교부 연례 회의에서 부산과 경남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때부터 부산과 경남은 모두 호주장로교회의 선교 교구가 되었다.
실제로 부산에 호주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891년이다. 즉 북장로교회는 1891년 9월에, 호주장로교회는 10월에 각각 부산에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를 시작했으므로 출발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 각각의 교회들이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서 성장해 나갔다. 초기에 설립된 교회들 가운데 부산진교회는 호주 선교사들이 1892년에 매입한 좌천동 686번지 일대의 부지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지은 선교사들의 주택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부산진교회의 시작이다. 1891년 10월 12일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민들을 초청하였고, 1892년 12월 16일 한옥을 매입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TGC 칼럼] 부산 선교의 동반자 1 20240627 church1](https://gpnews.org/wp/wp-content/uploads/2024/06/20240627_church1.jpg)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는 1894년 4월 22일 심상현과 여자 신자인 이도념, 김귀주 등이 최초로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베어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부산 지역의 최초 세례 받은 신자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분명히 호주 선교사들이 시작한 공동체인데,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베어드가 세례를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1대 담임 목사인 엥겔(George O. Engel, 왕길지) 선교사에 의해서 1904년 심취명을 장로로 장립시켜서 부산진교회는 경상도 최초의 조직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시작 당시에 마련한 한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됨으로써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의 예배당은 1985년 800평 규모로 붉은 벽돌로 지은 것인데, 이것은 여섯 번째 예배당이다. 그 후 예배당 앞에 2007년 왕길지 기념관을 지었는데, 이것은 예배당과 함께 부산진교회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 만큼 교회 주변에는 이 교회만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윗 마당에는 1931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다. 설립자 멘지스(Miss Belle Menzies)와 무어(Miss Elizabeth S. Moore)의 공덕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이 둘은 여성의 몸으로 부산 선교의 선봉에 선 사람들로 부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이들로서 기억되고 있다.
먼저 멘지스는 호주장로교회가 1891년에 파송한 사람으로 부산진교회와 일신여학교를 설립한 당사자이다. 초기부터 1924년까지 30여 년 동안 부산 지역의 전도와 교육사업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 따라서 호주장로교회의 후배 선교사들에게 ‘호주 선교부의 어머니’ 즉 ‘대모(代母)’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 무어 선교사는 1892년부터 1912년까지 부산에서만 사역했다. 그 후 통영으로 옮겨 그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다.
또 하나의 기념비를 볼 수 있다. 부산과 경남 선교에 깃발을 들었던 호주장로교회 첫 번째 선교사 데이비스의 희생을 기념하는, 교회 정문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스 기념비’이다, 이 기념비는 2001년에 세워졌다. 데이비스의 희생은 특별한 것이기에, 이 비석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진교회는 호주선교부와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 선교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앞에 남아있는, 1905년에 설립한 일신여학교 건물이다. 건평 285평 2층 건물인데 붉은 벽돌로 지었다. 초기 선교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했던 학교 교육이 이곳 부산에서도 호주장로교회 선교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현재 이 건물은 부산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초기에 교육을 받던 자료들과 부산 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진원지로 기억되도록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에는 호주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상이 담겨있다.
![[TGC 칼럼] 부산 선교의 동반자 2 20240627 church2](https://gpnews.org/wp/wp-content/uploads/2024/06/20240627-church2.jpg)
일신여학교는 고등과를 설치하면서 1925년 동래 복천동으로 옮겨 동래일신여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1940년 3월 30일 신사참배 반대와 함께 폐교당했다.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되면서 호주 선교사들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폐교된 이 학교를 지역의 유지들이 그대로 인수하기 위하여 구산학원이라는 법인을 구성해서 다시 개교하면서 동래고등여학교로 교명을 바꾸게 되었다. 그 역사를 잇고 있는 것이 현재 동래여자중고등학교이다.
전국에 산재한 미션스쿨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산에서도 일신여학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1919년에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은 부산 지역의 만세운동을 촉발했다. 당시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11명 중 부산진교회 신자가 9명이었으며,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박신연 교사는 부산진교회 주일학교 교사였고, 동시에 이 교회의 초대 영수를 거쳐 장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진주와 통영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심두섭, 문복숙 등도 부산진교회 신자였다. 그런가 하면 1945년 해방 직전까지 부산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을 당한 차병곤, 정오연 등도 이 교회 학생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공간은 부산 근대사에서 잊힐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난 1984년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고 있다.
부산진교회가 호주장로교회 선교부지에 있었기 때문에 일신여학교와 함께 세워진 일신기독교병원도 주변에 있다. 이 병원은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6.25사변 이후에 재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부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1952년 호주 선교사 헬렌 맥켄지(Helen P. Mackenzie)와 캐더린 맥켄지(Catherine M. Mackenzie) 자매가 입국해서 일신부인병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자매들의 아버지인 제임스 맥켄지(James N. Mackenzie)는 1910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29년 동안 부산 감만동 상애원(相愛園)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한센환자들과 일생을 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준 선교사이다.
그러한 아버지가 섬기던 부산에 돌아와서 산부인과 의사인 헬렌과 간호사인 캐더린은 전쟁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한 부인과 병원을 개원해서 돌보았다. 이렇게 시작된 역사를 잇고 있는 것이 일신기독병원이다. 따라서 맥켄지 자매의 사랑과 헌신을 잊을 수 없어 그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일신기독병원 별관(맥켄지기념관) 3층에는 ‘맥켄지 선교관’을 만들어 맥켄지 부녀가 남긴 선교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방문자들은 이곳에서 사진과 자료로나마 부산에서 2대에 걸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TGC 칼럼] 부산 선교의 동반자 3 20240627 church3](https://gpnews.org/wp/wp-content/uploads/2024/06/20240627-church3.jpg)
글 이종전 | 이종전 목사는 고베개혁파신학교(일본), 애쉬랜드신학대학원(미국)에서 수학하고, 1998년부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은퇴하여 석좌교수와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인천 어진내교회를 담임하며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C채널 ‘성지가 좋다’ 국내 편에서 역사 탐방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장명근 | 장명근 장로는 토목공학 학부(B.S.)를 마치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환경공학(M.S & Ph.D)을 공부했다. 이후 20년간 수처리 전문 사업체를 경영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삼양이앤알의 대표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정동제일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다.
이 칼럼은 개혁주의적 신학과 복음중심적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2005년 미국에서 설립된 The Gospel Coalition(복음연합)의 컨텐츠로, 본지와 협약에 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www.tgc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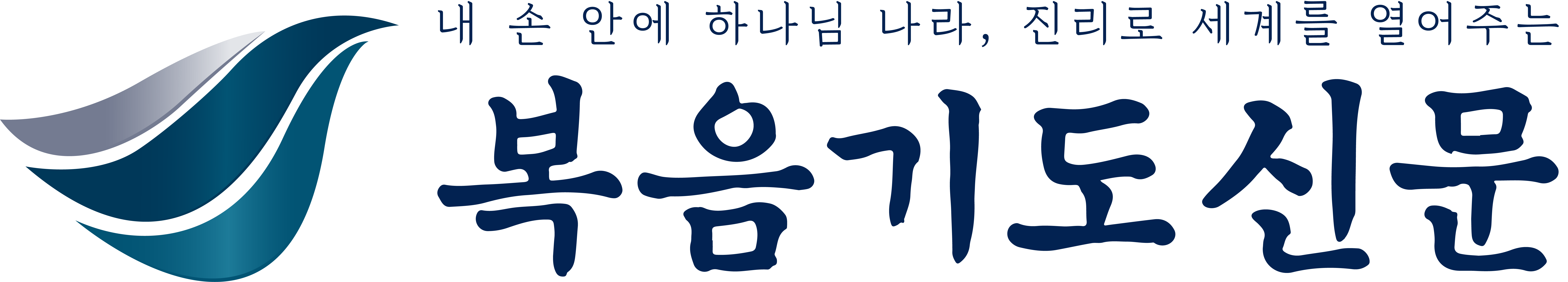

![[TGC 칼럼] 부산 선교의 동반자 4 Print Friendly, PDF & Email](https://cdn.printfriendly.com/buttons/printfriendly-pdf-email-button-notext.png)